
2017년 처음으로 모든 유로존(Euro zone) 국가들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아래로 떨어졌다. 이것은 안정⦁성장협정(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부합한다. 이것이 유로위기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하는가? 비관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인가? 정부는 이제 환호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려도 되는가?
그러나 유로위기가 종식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으며 정부의 재정능력은 여전히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
첫째, 안정⦁성장협정은 모든 회원 국가들이 서명한 유럽재정협약(European Fiscal Compact) 또는 재정안정화조약(Fiscal Stability Treaty)에 의해 더 엄격하게 강화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일은 유럽안정화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즉 영구적인 유럽긴급자금(European bailout fund)을 지원하는 대가로 이런 강화를 요구했었다. 과거 몇몇 나라에서 재정적자가 호황기 때 3% 한계에 근접했으나 침체기 때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안정화조약은 (구조적으로) 균형예산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0.5%의 재정적자는 (정부부채가 GDP의 60% 아래라면, 1%의 재정적자는) 균형예산으로 간주하며, 침체기 때에만 GDP의 3%까지 증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 조항이며 호황기 때 흑자예산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더욱이 재정안정화조약은 ‘부채제동(debt brake)’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부채가 GDP의 60%를 초과하면, 매년 초과 부채의 5%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00%라면, 부채는 연 2%(40%의 5%) 떨어져야 한다.
[재정적자, 2013~2017] (GDP 대비 %, 2017년은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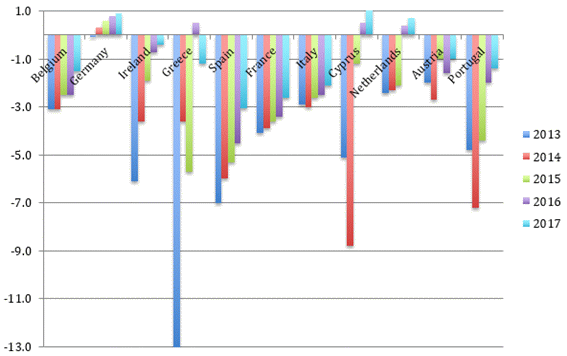
[정부 부채, 2016]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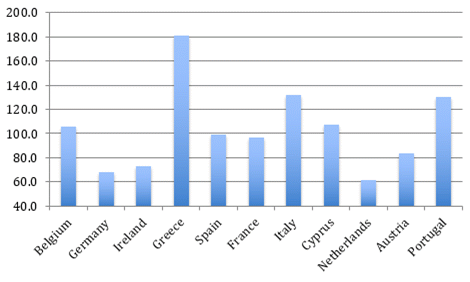
위의 두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엄격해진 재정안정화조약을 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유로존 국가들은 침체기에 있지 않으며 흑자예산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전히 재정적자 상태다. 불행하게도 새로운 규칙은 느슨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 한 나라가 “조정 경로” 중이라면, 그 나라의 정부재정 개선은 충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ECB(역자주: 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는 -‘전면적 통화거래(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를 통해- 이자율을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정부채권을 직접 구매하기 시작함으로써 마스트리트조약(Maastricht Treaty)을 철저히 위반했다. 그러면서 유로존 경제는 성장 중이다. 단기 정부채권 중 일부는 그 수익이 마이너스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 측에서 보면 달콤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위적이며 예외적인 것일 뿐이다. 유로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상’ 이자율에서의 장기부채 안정화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부채의 이자율이 3%까지 올라간다면, 재정적자는 치솟을 것이다: 이자율이 3%보다 더 높았더라면, 위의 2017년 정부의 재정적자를 참조해라.
셋째, 유로위기의 중심에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유로는 잘못된 구조물과 같다. 독립된 개별 정부는 하나의 중앙은행 시스템을 통해 빚을 질 수 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달콤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적자경영을 하고자 할 때, 그 나라는 정부채권을 발행한다. 은행은 이 채권을 매입하여 ECB(유럽중앙은행)에 이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우량의(fresh) 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는 ECB가 직접 이 채권을 매입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의 신규 준비금으로, 은행은 신용과 화폐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이것은 재정적자 나라뿐만 아니라 유로존 모든 국가들에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재정적자 비용은 부분적으로 다른 유로 국가들의 시민들에게 외부화 된다. 정부가 자국의 시민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외국인들이 그 대금의 일부를 유로의 구매력 저하 형태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공유지비극(tragedy of the commons)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모든 유로존 정부들은 다른 국가의 비용으로 자국의 이득을 얻기 위해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느 한 정부의 재정적자가 나머지 다른 유로존 국가들보다 높다고 하면, 이 정부는 이런 재분배 메커니즘으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가격은 정상적인 정부지출 때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이 지독스러운 유혹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통제되지 않으면 그 유혹은 공통의 화폐를 결국 붕괴시키고 말 것이다.
유로라는 구조물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유로가 오래도록 작동하게 하는 하나의 해결책은 정부지출과 재정적자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유지(역자주: 유로화 통화량)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은 그렇게 하는 데 실패했다. 지금까지 회원국들에 의해 이미 110개 이상의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재정안정화조약(Fiscal Stability Treaty)도 마이너스 이자율과 경기확장을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정부지출은 2007년 거품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재정적자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유로존 정부들은 그들의 지출을 삭감하고 있으나 그것은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액의 감소와 통화정책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확장 때문이다.
[2007~2016년 정부지출의 변화] (자체 계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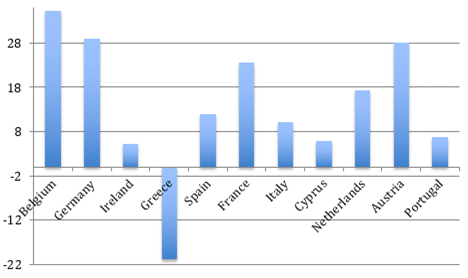
유로라는 구조물 문제의 또 다른 해결책은 각 정부의 예산을 관리하고 보다 근검한 정부에서 보다 낭비가 심한 정부로 부(富)를 이전하는 최종적인 단일의 유럽 국가를 향한 과도기동맹(transfer union)을 설립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ESM(유럽안정화기구), 은행동맹(bank union), 그리고 정부채권의 ECB 직접 구매는 이 방향으로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역자주: European Commission, 유럽집행위원회)는 추가적인 여러 조치들을 담은 “로드맵(Roadmap)”을 제안했다. 나쁜 정책에 의한 비용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의미의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MS(역자주: European Monetary System, 유럽통화제도)의 5천억 유로가 유럽통화기금(EMF: European Monetary Fund)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유럽통화기금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해 은행을 긴급 구제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한 명의 유럽 경제⦁재무 장관의 임명을 원하고 있다. 부(富)와 위험의 이 모든 재분배는 과거의 나태와 실수의 대가이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더 많은 정부지출을 함축한다.
유로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유로존의 해체를 용인하는 것이다. EU안에 여전히 머무르게 하면서 질서 있는 퇴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퇴출비용을 줄이고 퇴출의 개연성을 높이며 그래서 각국의 정부가 스스로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세 방안 중 무엇이 채택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다음 경기 침체기가 도래해서야 비로소 결정될지 모른다.
저자) Philipp Bagus
Universidad Rey Juan Carlos 조교수, 미제스연구소 associated scholar, IREF 학자
역자)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원문) https://mises.org/wire/eurocrisis-over
▶자유와 시장경제에 관한 더 많은 글을 「미제스와이어」(www.mises.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